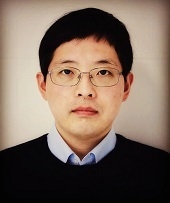
수소경제사회를 놓고 대부분 ‘실현여부’보다는 ‘언제’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쉽게 말해 오는 건 기정사실에 가깝지만 얼마나 빨리 오느냐가 관건이라는 얘기다. 예상 시기는 개인차가 있지만 결국 수소경제사회가 올 것이라는 생각은 이견이 없는 셈이다.
수소선진국으로 꼽히는 해외국가들의 수소산업정책을 살펴보면 결국 정부가 거시적인 로드맵을 짜고 선두에서 이끌고 있다. 특히 일본은 국가적 차원에서 수소경제사회를 공언한 상태다.
하지만 국내 사정은 다르다. 눈에 띄는 건 정부가 아닌 민간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을 후원하는 수소전기차, 올림픽 기간 내 시내버스로 활용되는 수소전기버스, 강릉과 평창에 구축된 수소충전소, 오는 2020년 완공이 목표인 수소부품성능시험센터, 주유소 부지를 활용한 복합 수소충전소 구축 MOU 등 굵직한 현안들은 모두 민간과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공을 들이고 있다.
반면 환경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중 친환경차 200만대 보급계획에서 2022년까지 수소차는 1만5,000대 보급에 그치고 있다. 심지어 이마저도 현재 정부의 수소에너지 정책 스탠스를 보자면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수소경제사회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부족하다고 토로한다. 특히 수소경제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실행 중인 일본과 비교하면 현 국내 수소산업상황은 더욱 암울하다고 입을 모은다.
결국 수소경제사회는 올 것이다. 관건은 ‘시기’다.
사막에서 우물을 파는 심정으로 수소경제사회를 준비해 온 민간의 노력에 향후 정부가 ‘숟가락만 얹는다’는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
수소경제사회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선택이 아닌 필수기 때문이다.

